연(緣) - 가온 최명숙
2010.03.03 21:01
연(緣)
추위가 가기도 전에 동생은 아들을 군(軍)에 보냈습니다.
보냈다기 보다는 일정기간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빼앗겼다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남자로써 자랑스럽고 유익한 기간이라고 스스로 위로해보지만
어릴 때부터 유난히 생각이 깊고 기특하기만 했던 조카아이가
작은 체구, 여린 가슴으로 부모의 품을 떠나 겨울보다 시린 봄눈이 쌓인 강원도에서
훈련 받을 걸 생각하면 나도 이렇게 가슴이 아려오는데
자식에 대해 애착이 유난히도 강한 동생은 오죽할까 싶습니다.
소중한 보석 하나를 2년 동안 나라에 바치면서
자식을 군에 보내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라는 생각을 했다고
울먹이는 동생을 보면서 부모와 자식의 연(緣)을 생각해봤습니다.
나는 몸으로 자식을 낳아 본 경험은 없지만
자식을 낳아 세상에 내놓다는 것은 어쩌면 가장 깊고 깊은 자신의 속살 한 덩이를
탯줄처럼 보이지 않는 연줄이 이어진 채로 내 놓는 것과도 같은 것이지요.
그 속살 한 덩이, 세파에 나부낄 때마다 전류처럼 짜릿 짜릿하게 아픔을 느끼며
평생을 살아가는 게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식은 성장하여 보호막인 부모로부터 벗어나면서 부모에 대한 의식이
껍질에 대한 향수와 연민으로 퇴색해가는 것을 봅니다.
그 향수와 연민을 삶의 저변에 둔 채 자식은 새로운 향기를 갈망하며 날아가지요.
요지부동 곁에 있는 부모님의 사랑은 이미 그리움이라는 자리를 빼앗기게 되고
그 자리에서 다른 향기가 그리움으로 자라게 되지요.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이러한 심리 상태를
‘붉은 꽃밭에서 그는 소리쳐 부르는데 흰 꽃밭에서 어머니는 미소를 띄운다..’로
표현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바라만 봐도 아프디 아픈 자식이었던 나는
지금도 아버지의 사랑을 잊을 수는 없지만
어릴 때에는 하늘같았던 아버지의 존재가 이제는 향수와 연민으로 노을빛이 되어
내 삶의 저변에 깔려 있을 뿐입니다.
인공호흡기를 꽂고 마지막으로 한 번 눈을 떴다가 감으실 때,
아버지는 남편과 함께 있는 나를 바라보시면서 손짓을 하셨습니다.
가까이 오라는 뜻으로 알고 다가갔지만
아버지는 그 후로 다시는 눈을 뜨지 않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때 그 무언의 뜻은 “나는 이제 떠난다. 그러니 부디 잘 살아라”라는
당부이셨음을 후에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내 아버지는 이제 껍질이 되어 흙 속에서 삭아져가고 있지만
내 중심에 영혼의 탯줄로 이어져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은
지금도 연(緣)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나를 보호하고 계시지요.
세상에서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남편과 연을 맺게 하셨으며
여러 지인들과 삶에 공감대를 나누게 하시고,
늘 착한 자녀들을 가족으로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연을 맺은 아들, 딸들과도 긴 세월 오가며 정을 나누게 하시며,
명절에는 귀여운 손주, 손녀들의 세배까지 받게 하십니다.
껍질은 마땅히 껍질이 되면서 자연의 질서를 이루어가지만
내 존재의 껍질인 아버지의 육신이 삭아져 가는 그 곳, 묘지에는
나풀거리는 나비의 날개 짓도 쓸쓸하고,
묘지 앞, 넓은 방죽의 물빛이 유난히 눈이 시린 까닭도
햇살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댓글 2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147 |
사람에게 비는 하느님
[1] | 구인회 | 2010.03.12 | 6255 |
| 146 |
살아계시는 나의 아버지
[1] | 구인회 | 2010.03.11 | 6105 |
| 145 | 지혜의 정점은 사랑( 하나 되는 것) [1] | 요새 | 2010.03.07 | 6260 |
| » | 연(緣) - 가온 최명숙 [2] | 물님 | 2010.03.03 | 6232 |
| 143 |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하느님의 자녀 [1] | 요새 | 2010.02.21 | 7017 |
| 142 | 가족예배 - 인식과 이해 [1] | 요새 | 2010.02.14 | 6281 |
| 141 | 주의 기도 [1] | 물님 | 2010.02.11 | 6442 |
| 140 |
불재의 웃음
| 구인회 | 2010.02.09 | 6434 |
| 139 | 가온의 편지 -군산 베데스다 예수마을 [2] | 물님 | 2010.02.08 | 6404 |
| 138 | 존재를 찾아가는 사람들 [2] | 요새 | 2010.02.08 | 631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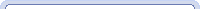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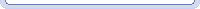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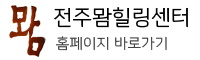

몸에서 낳은 자식을
영혼으로 또 한번 낳으시는 가온님
베데스다 영혼의 어머니 가온님의
아버지와 자식 사랑이 크게 다가옵니다.^^